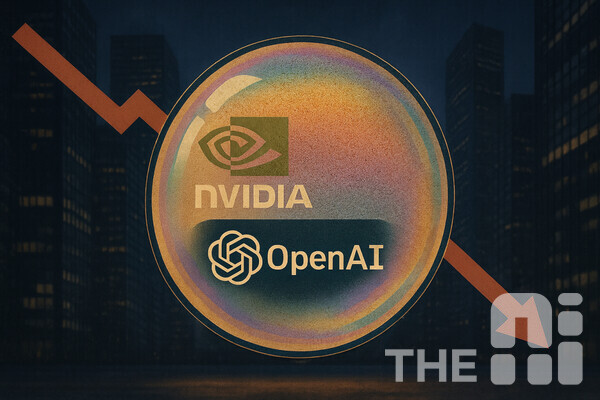
AI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 엔비디아와 오픈AI는 연일 찬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GPU 판매로 천문학적 매출을 기록하고, 오픈AI는 챗GPT를 앞세워 불과 2년 만에 세계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AI 시대의 승자로 불리며, 산업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러나 바로 이 두 기업의 사례가 역설을 드러낸다.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투자자들은 의문을 거두지 못한다. 이는 ‘돈을 버는 기업은 존재하지만,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명제를 떠올리게 한다.
◇ 놀라운 성과, 그럼에도 불안한 AI 시장
엔비디아의 상승곡선은 멈출 줄 모른다. 최근 엔비디아가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570억 달러(약 83조4000억 원)로 시장 전망치인 549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라며 실적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블랙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JP모건의 조사에 따르면, 블랙웰 GPU는 지난해 이미 12개월 분량의 예약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다. 이처럼 시장을 압도하는 GPU는 엔비디아의 또 다른 이름이자 성장을 담보하는 황금알이 됐다.
오픈AI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상반기에만 4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수익보다 16% 증가한 수치였다. 포천(Fortune)은 오픈AI의 올해 연간 매출을 130억 달러 규모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한 다음날, 뉴욕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 매도가 이뤄지다가 이틀째 다시 시장이 회복하는 등 급등락이 반복됐다. AI 시장의 대표 승자들이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을까.
◇ 수익성의 역설 ‘돈을 벌수록 돈을 잃는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화려한 실적 뒤에는 웃지 못할 역설이 숨어있다. 포천의 조사에 따르면, 오픈AI가 연 1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오픈AI는 올해 안으로 90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총 115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이 전망된다. 2028년까지의 운영 손실은 매출의 약 4분의 3에 달한다. 이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익을 앞서는 것이다. 2023년 약 30억 달러에서 시작된 현금 지출은 2029년까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오픈AI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태우고 있다는 의미다.
빅테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등 빅테크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부채까지 늘리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의 회계 관리다. 지난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내용연수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2023년 회계연도에만 약 30억 달러의 감가상각비를 줄였고, 알파벳도 같은 해 서버 내용연수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려 39억 달러를 비용에서 제외했다. 30억 달러의 순이익을 늘렸다.
기술 수명은 짧아지는데 장부 속 내용연수는 길어진 셈으로, 현실에서는 GPU와 서버의 기술적 수명이 오히려 줄고 있어 기술 수명과 회계 수명이 따로 노는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다시 말해 반도체는 2~3년이면 구형이 되는데, 장부상으로는 6년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빅테크조차 AI에 투자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생태계를 위협하는 순환 투자의 함정
현재 AI 시장 구조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주요 플레이어들이 복잡하게 얽힌 순환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AMD는 오픈AI에 자사 주식의 최대 10%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며, 엔비디아는 오픈AI의 AI 데이터센터에 최소 10기가와트(GW)의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협력을 진행하며 사실상 오픈AI의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핵심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오픈AI 영리 부문 이익의 최대 49%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위브의 주요 고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코어위브가 바로 엔비디아로부터 상당한 지분 투자를 받은 AI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코어위브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엔비디아 하드웨어 대량 구매는 엔비디아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복잡한 거래 관계는 마치 돈이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A가 B에 투자하고, B가 C에서 서비스를 사고, C는 다시 A의 제품을 구매하는 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이에 월가의 유명 투자자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Michael Burry)는 “AI 산업은 복잡한 회계 정책 뒤에 숨었고, 최종 수요는 터무니없이 적으며, 거의 모든 고객이 딜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순환적 형태를 띠는 금융 구조에서 특정 기업이 흔들리는 경우 전체 시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