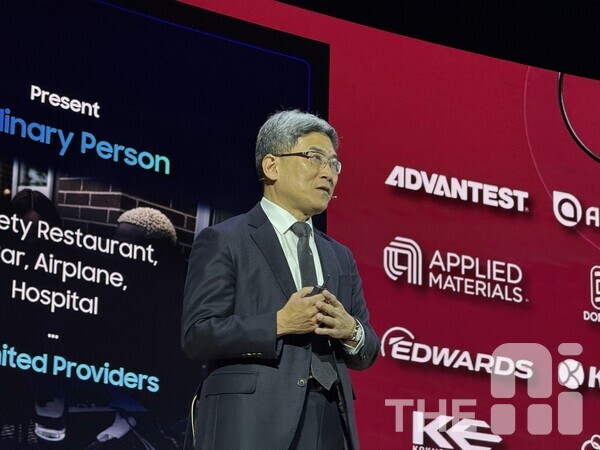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하기 위해선 패키징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세공정뿐 아니라 패키징에서의 혁신이 이뤄져야 반도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단 분석이다.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세미콘2025 키노트 연설에서 반도체 패키징 혁신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면서 “특히 AI를 지원하기 위해선 메모리 로직(연산)을 합친 칩렛 기술 등을 통한 패키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곧 3D 스트럭처로 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소재와 기술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백엔드의 저항을 줄이는 등의 과제들이 남았는데 패키징에서 이 모든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키징은 제조된 반도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반도체 회로에 있는 전기선을 외부로 연결하는 공정이다. 반도체 전체 공정 중 후(後)공정에 속한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뉜다. 전공정은 웨이퍼의 패턴을 찍고, 물질을 덮고, 깎고, 씻는 과정을 약 2개월간 수백 회 반복하는 공정이다. 후공정은 전공정 과정을 통해 제조된 반도체를 포장하는 패키징을 의미한다.
반도체 업체에서는 반도체 성능향상을 위해 전공정에서 회로 선폭을 좁히는 미세공정 기술개발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10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으로 내려오면서 공정 미세화만으로 반도체 성능과 전력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고 평가됐다. 대안으로 꼽힌 기술이 첨단 패키징이다. 패키징 기술이 발전할수록 칩 사이즈 축소, 절전,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 CTO가 패키징 기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첨단 패키징에서 대표되는 기술은 3D 적층기술이다. 전공정을 마친 두 개 이상의 칩을 얇게 쌓아 올려 하나의 반도체로 만드는 패키징 기법을 뜻한다.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역할을 하는 로직 칩 위로 캐시메모리(임시저장장치) 역할을 하는 S램을 3D 형태로 쌓아 올린다. 하나의 칩 안에서 연산과 저장이 함께 된다고 보면 된다. 신호 전송 경로를 줄일 수 있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메모리를 계속 쌓아 올릴 경우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커진다.
이종 집적화 기술도 주목되는 패지징 기술이다. 인쇄회로기판(PCB) 대신 인터포저라는 판 위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올려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기술을 뜻한다. 여러 개의 칩을 한 개의 패키지 안에 배치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패키지 면적을 줄일 수 있다. 또 작은 폼펙터(구조)로 다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AI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송 CTO는 “AI 기술이 우리 반도체를 활용해 목표점을 따라가는 데에는 높은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1년 만에 했던 것을 요즘은 2~3년 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 같은 경제로 퍼포먼스를 높이고 파워를 낮추는 것이 세미컨덕트 제품에서 가야될 방향”이라며 “패키징 기술이 우리의 기술적인 한계를 조금 더 나아가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는 AI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 자료를 만드는데 챗GPT나 제미나이에 조금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이들이 주는 가이던스는 우리의 단위 시간이나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AI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도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AI 테크놀로지도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과학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기여해줬다”며 “장담컨대 우리들 전체 휴머니티의 협업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